생전 '내 뜻대로 장례'를 준비하고 싶은 할머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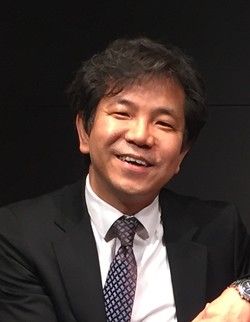
지난 8월 말, 「서울시 공영장례지원 상담센터」인 '나눔과나눔'으로 80대 중반의 할머니가 상담 전화를 했다. 할머니는 텔레비전에서 공영장례 관련 보도를 봤다며, 본인의 장례도 부탁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물었다.
당연히 할머니의 부모는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할머니는 결혼하지 않아 자녀가 없었다. 직계가족이 한 명도 없는 것이다. 형제분들도 할머니보다 먼저 돌아가셔서 할머니가 직접 형제들의 장례까지 모두 챙기셨다고 한다. 다행히 조카들과는 가까이 살면서 관계도 좋았다. 그렇다고 조카들에게 장례까지 부탁하고 싶지는 않았다. 할머니는 평생 열심히 살면서 작은 집 한 채도 마련했고, 이제 살날이 많지 않아 스스로 장례 비용도 마련해 두었다.
할머니의 요청 사항은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장례비용을 마련해 두었으니 첫째, 살아 있을 때 미리 장례를 약속받고 싶다. 그래서 본인이 사망하면 가족 대신 본인의 시신을 화장해 해양장으로 뿌려달라는 것, 둘째, 남은 재산은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에게 유산기부 하고 싶으니 대신 전달해달라는 것이다. 장례와 유산기부에 대해서는 조카들도 동의했다고 한다.
안타깝게도 생전에 '내 뜻대로 장례'를 약속받고 싶은 할머니의 첫 번째 소원은 현행 법률로 보장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유언으로 나와 친밀한 관계의 사람 또는 누구든 '생전에' 장례를 부탁한 후 사후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장례를 치르는 일은 「민법」에서 정한 유언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현행 「의료법」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법률혼과 혈연관계가 아닌 사람이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아 장례를 치르려고 하면 한계가 여전히 있기 때문이다.

◇장례 관련 유언은 참고 사항일 뿐
사람들은 흔히 유언장을 작성하면 모든 것을 고인의 뜻에 따라 강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여기서 장례 관련된 사항은 해당하지 않는다. 「민법」에서 유언은 상속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즉, 시신의 인계 및 장례에 관한 사항은 유언에 따라 법률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나의 장례를 누군가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해달라고 유언한다고 해도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만약 고인이 화장해 달라는 유언을 남겼는데 자녀들이 고인을 매장했다고 불법은 아니다. 판례에서도 화장 또는 매장 등과 같이 장례와 관련해 생전 고인의 의사가 있다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이상 이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이것은 도의적 의무일 뿐이라고 했다. 다시 말해 제사주재자인 자녀가 무조건 생전 고인의 의사를 따라야 하는 법률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관련 판례: 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
실제로 2016년 사망한 A씨는 "내가 사망하더라도 전 아내와 자녀들에게는 절대 알리지 말고 장례식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달라"라며 A씨의 누나에게 유언을 남겼다. 고인의 유언에 따라 A씨의 누나는 동생의 사망 사실을 고인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알리지 않고 장례를 치르고 화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그것이 유언에 따른 것이었더라도 제사주재자의 권리를 침해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관련 판례: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가단231672)
이처럼 아무리 생전 고인과 친밀한 관계인 사람이라도 법률상 구속력이 없는 유언을 근거로 장례를 치른 것은 제사주재자가 있다면 이들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장례 관련 유언은 참고 사항일 뿐 법률적 의무는 아니다.
생전 본인의 장례 약속과 유산기부라는 사회적으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바람을 가진 할머니는 "뭐가 이렇게 복잡하냐?"며 "생전에 내 돈 가지고 내가 장례를 부탁하고 싶어 유언하겠다는데 법이 왜 보장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꼭 법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1코노미뉴스= 박진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