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장례가 있어 시민들 애도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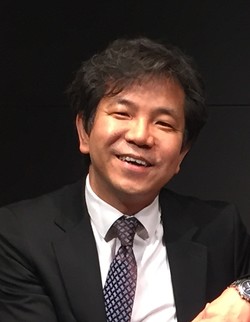
또 죽음이다. 언제까지 이런 죽음이 반복될지 가늠조차 할 수 없다. 서글프다. 2014년 2월 '송파 세모녀'가 다시 떠오른다. 그때의 기억으로 아직도 아픈데 오늘도 다시 죽음과 마주해야 하는 상황. 그때처럼 전문가들은 이런 죽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분석하고 지자체는 재발 방지 대책을 발 빠르게 내놓느라 분주하다.
그래도 8년 전 송파 세모녀 때와는 확연히 변화된 점 한 가지가 있다. 공영장례다. 송파 세모녀 때만 해도 공영장례 조례는 전국 4개의 지자체에만 제정했었다. 당연히 서울시에도 공영장례조례는 없었다. 그래서 돌아보면 송파 세모녀의 장례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수원시는 지난해 2월 「수원시 공영장례 조례」를 제정했다. 다행히 조례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세모녀의 시신을 인도할 사람이 없자 수원시는 공영장례로 세모녀의 장례를 지원했다.
"외롭고 쓸쓸하지만은" 않은 마지막 가는 길
69세의 암치료를 받던 엄마, 희소 난치병을 앓고 있던 40대 두 딸은 병과 빚으로 인한 생활고로 버겁게 살다 "살기 힘들다"는 유서를 쓰고 숨진 채 발견됐다. 게다가 도움을 주던 먼 친척이 시신인수를 하지 않으면서 무연고사망자가 되었다.
이러한 죽음의 경위와 장례 할 사람이 없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상황인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삶에 이어서 장례까지도 "외롭고 쓸쓸했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과연 이들의 삶뿐 아니라 장례까지도 외롭고 쓸쓸했을까?
수원시는 공영장례 진행을 위해 장례식장 특실에 빈소를 마련했다. 통상 공영장례는 하루장이지만 이번에는 삼일장으로 치렀다. 상주는 수원시 공무원들이 맡았고 마련된 빈소에는 시민 100여 명과 경기복지연대, 수원사회복지사협의회 등 시민단체에서도 고인을 애도하기 위해 찾았다. 원불교 성직자 7명이 고인들을 위해 종교예식을 진행했다. 국무총리를 비롯해 경기도지사와 수원시장 등 여러 정치인도 조문을 오고, 대통령은 조화를 보냈다.
아마도 공영장례조차 없어 누구도 애도할 수 없었다면, 고인의 삶과 죽음만큼이나 장례식도 없는 그들의 마지막 가는 길은 외롭고 쓸쓸했을 것이다. 다행히 공영장례를 통해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은 외롭고 쓸쓸하지만은 않았다.
고인의 존엄함을 위한 공영장례
공영장례는 사망 후 시신을 처리하는 장사 절차뿐 아니라 고인이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고인의 애도받을 권리와 함께 유가족과 지인 등이 고인의 애도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공공(公共)이 빈소를 마련하고 장례의식을 지원하는 장례다.
한 인간의 존엄은 특별하고 대단한 일을 통해서만 증명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존엄하다는 건 서로 확인해줘야 알 수 있다. 내가 인간이고 또한 당신이 인간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사소하다 싶은 행위만으로도 충분하다. 공영장례 빈소에 와서 100여 명의 시민들이 올린 국화꽃은 세모녀가 우리와 같은 하늘 아래 함께 살았던 존엄한 인간이었음을 서로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물론 고인들의 친척과 더 많은 지인이 장례에 참여했다면 좋았을 것이다. 수원 세모녀의 빈소가 마련되었던 첫날에 먼저 세상을 떠난 아들의 친구, 동네 선배가 조문을 왔다고 한다. 하지만 이후 다른 지인이 조문을 더 했는지 친척들이 왔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달리 생각해 보면 과연 그 많은 취재진과 기자들 앞에 내가 세모녀의 친척임을, 그리고 지인임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먼 친척이 시신 인수를 포기한 것도 그런 이유는 아니었을까?
빈소에는 영정사진 없이 위패 3개만 올라갔다. 그걸 보고 2019년 '성북 네모녀'의 장례가 떠올랐다. 성북 네모녀의 장례는 서울시 공영장례로 치러졌다. 그때 서울시와 나눔과나눔은 공영장례를 지원하며 함께 고민했다. 빈소에 영정사진을 올릴지 말지를 말이다. 고민 끝에 고인들의 얼굴이 언론에 공개된다면 고인의 가족과 친척들에게 혹시 모를 사회적 비난이 갈 수도 있겠다는 판단으로 준비한 영정사진을 올리지 않았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공영장례에는 고인의 영정사진이 올라간다. 가끔은 주민등록 사진을 동주민센터 등을 통해 받기도 한다. 하지만 이번 경우처럼 사회적 이목이 쏠려 취재진이 많은 경우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이번 수원 세모녀의 장례를 "유족도, 영정사진도" 없어 외로웠다기보다는 "유족도, 영정사진도" 없지만, 시민들과 이웃들이 공영장례로 함께 해서 마지막 가는 길은 따뜻했다고 기억하면 어떨까? 비록 그들의 삶을 지켜주진 못했지만, 우리 사회가 죽음 이후의 장례만큼은 다 같이 책임졌다고.
<위 글은 외부 기고 칼럼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무관합니다.>

